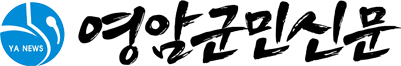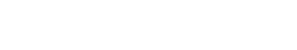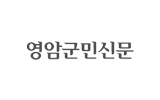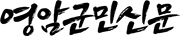석전(釋奠)은 봄, 가을로 1년에 2회 열리며 공자의 위폐가 모셔져 있는 사당인 문묘 성균관대학교 대성전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의 전통 제례문화를 엿볼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향교는 공명의 道를 바르게 세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초 덕목을 교육하는 곳이었으니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았다.
새로 부임하는 고을의 수령은 맨 먼저 향교를 찾아 문묘에 알현하고 ‘교육을 장려할 것이며, 호구 증가에 힘쓰며, 농업을 진흥할 것이며, 송사를 신속하게, 형벌을 공평하게 부과할 것’ 등 5강을 맹세하며 성현들께 머리를 조아리니, 이는 곧 유교의 도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한 덕치(德治)를 다짐하는 것이었다.
또 향교의 춘추 석전은 고을 수령의 필참 하에 봉행되었으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제 헌관의 서열 또한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학덕과 문지와 인망을 가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오늘날 헌관은 군수가 초헌관을, 교육장이 아헌관, 경찰서장이 종헌관을 맡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 군수는 초헌관으로서 유림을 비롯한 군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자와 성현들께 헌사하며 선정을 다짐하는 자리이니 그 또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지단달 20일 봉행된 영암향교의 추계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추대된 군수가 불참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의례에 군수에게는 만사를 뒤로 하고 초헌관을 맡아야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거늘, 망장(望狀)을 받고도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불참한 것은 심히 유감(遺憾)스러운 일이다.
‘바쁘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그 시간 관내엔 특별한 행사도 잡혀있지 않았고, 부군수의 대리 참석도 없었으니 말이다. 군수는 영암군내 1천여명의 유림과 군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랑과 예의, 그리고 인격의 완성을 통해 유교의 도를 세우고자 했던 공자의 정치사상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25.12.16 20:35
2025.12.16 20:3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