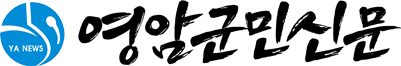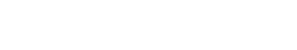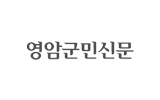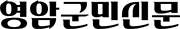한반도에 전운(戰雲)이 감돌더니 기어이 민족화합과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쌓아올렸던 남북교류협력의 산물들이 하나둘씩 물거품 되더니 개성공단까지도 폐쇄의 전 단계에까지 근접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에서 10㎞ 떨어져 있다. 공단이 들어선 곳은 원래 서울을 겨냥한 장사포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북측의 병영(兵營)이었다고 한다. 이런 곳이 2000년8월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공단으로 조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또 북측이 2002년11월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공단조성이 구체화됐다. 개성공단을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통일로 가는 길목’이자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으로 부르는 이유다. 보수언론들의 신바람에 가려 어떤 길이 옳은지 잘 분간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 조치에 따라 임박한 개성공단의 폐쇄가 낳을 파장은 자못 심각해 보인다. 정부는 피해액을 1조원으로 추산하나 업계에선 최대 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단폐쇄가 부를 남북의 군사적 긴장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우기는 북측의 피해도 만만찮다. 당장 5만3천여명의 직원들의 임금이 끊기고, 심지어 한국전력이 전력공급까지 끊으면 피해는 더 커진다.
정부가 내린 결정을 놓고 전략적 구상의 부재와 조급성, 소통부재 등의 지적이 이어진다. 심지어는 임기 5년 동안 남북관계를 끌고 갈 ‘큰 그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 철수 후의 전략 없이 과거(이명박 정부)와 다른 단호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일단 저지르는 즉흥성과 단호함만 돋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이 남북이 서로 물질적 이익을 꾀하는 합작 사업이 아니라 통일여정에 큰 디딤돌을 놓는 화해·협력 사업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지도 모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31 23:16
2025.12.31 23:16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