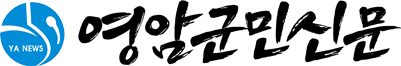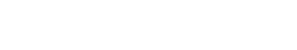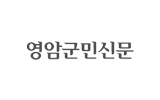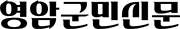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
백령도는 우리나라 8번째로 큰 섬이다. 인구는 약 5천명이며 농업종사자가 75%, 어업 종사자가 25%로서 미곡 생산량이 풍부하여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는다. 까나리액젓이 유명하여 까나리액젓을 만드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백령도에는 경관이 좋은 곳이 많다. 콩돌해변은 2km에 걸쳐 형형색색의 돌이 콩처럼 깔려 있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맨발로 걸으면 시리고 상쾌하다. 바닷가에는 자연이 조각해 놓은 여러 모양의 바윗돌들이 늘어서서 장관을 이룬다. 심청각이 북쪽을 향해 전망대처럼 자리하여, 날씨 좋은 날에는 북방한계선 조금 넘어 인당수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오래된 중화동교회와 교회박물관이 있고, 입구의 해묵은 팽나무들이 오랜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 군사 요충지로 해병대가 밤낮 없이 지키고 있다. 백령도에서 불과 10-12km 거리에 북한 해안기지가 있다. 이 짧은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북방한계선(NLL)이 가로막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우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까지의 우리 지역과 북한지역과의 바다 경계선이 되고 있다. 북방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우리도 이 선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선이 있어 우리 서해가 지켜지고 수도권의 서남쪽 방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령도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이 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새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북방한계선은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한계선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1953년 7월 23일 육상경계선을 설정하여 남북 양쪽에서 차지한 지역을 현실화해 250마일 휴전선을 그었다. 그 결과 동쪽은 38선을 훨씬 넘어 위로 고성까지 올라가 있지만, 38선상에 있는 해주 남쪽 개성, 장연 등은 북한측 관할이 되었다. 섬은 우리 군이 백령도 북쪽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바다에는 남북 경계선이 없었음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었다. 이에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서해5도와 북한측의 중간지점에 1953년 8월 30일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여 서로 넘어서는 안 될 해상경계선으로 선포했다. 북한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1959년 북한중앙연보에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였다. 1984년 수해물자를 북측에 전달할 때 북방한계선에서 전달했다. 1992년 남북합의서에도 남북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북방한계선이 해상 불가침경계선임을 확인 했다.
그런데 북한은 1999년 연평 교전을 벌여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시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2007년 10.4선언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설정’을 합의 포함 시켰다. 북한은 이 구역설정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뜻을 품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북방한계선은 우리의 생명선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서해5도는 우리 서해와 수도권을 방어하는 큰 함정과 같다. 남과 북의 바다 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이 무너지면 인천항과 국제공항, 서해어로,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방한계선이 반드시 수호되어야 함을, 백령도에 가보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31 23:15
2025.12.31 23:1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