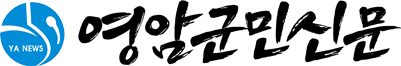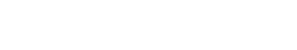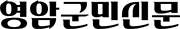안철수 후보를 적대 후보로 생각하는 큰 흐름이 있는 반면, 그를 ‘공동 후보’로 보는 인식 또한 작지만 엄연하다.
안 후보를 적대 세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승자독식주의의 관점이다. 단일화의 승자가 모든 걸 독점하고, 패자는 모든 걸 잃고 주저앉는다는 인식이다. 이 관점은 ‘민주당 지상주의’의 관점이기도 하다.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불임(不姙) 정당’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소속 후보인 안철수를 제압해 민주당 승리 또는 민주당 후보 승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살기 위한 모든 것은 선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입장에 설 때 민주당 사람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일방적으로 돕지 않고 중립적 쌍방주의에 서거나 안 후보를 배려하는 듯한 언행은 모두 ‘해당(害黨)행위’가 된다.
안 후보를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공동 후보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단일화를 민주당 승리보다는 대선 승리라는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 관점은 어떤 단일화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경계한다. ‘상처뿐인 단일화’로는 12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런 이들은 단일화 과정이 윈-윈 솔루션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누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건 궁극적으로 두 후보 함께 승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로 이분하고 있는 앞의 흐름과는 극명히 대척적이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 두 후보가 모두 승자가 되는 프로세스일 때 12월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민주당 승리보다 야권 승리가 더 우월한 가치이다. 이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공정해야 하고, 나아가서 민주당원으로서 안 후보를 돕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위 두 입장 사이의 핵심적 차이는, 요약하자면, 안철수 후보를 뭘로 보느냐와 민주당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있다. 안철수 후보를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의 적이냐 동지냐, 적대 세력이냐 우호 세력이냐, 제거 대상이냐 공존 대상이냐로 보느냐의 문제인 거다.
불행하게도,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과 주장은 압도적으로 앞의 것이다. 뒤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변한 의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채 그저 쉬쉬하고 있을 따름이다. 쥐 죽은 듯 숨죽여 근근이 간신히 몇 마디 해보곤 쏙 들어갔다가 다시 살짝 고개 내밀어 또 한 마디 하고 입 꽉 다물고 이리저리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다. ‘민주당 승리 지상주의’의 질풍노도 속에 ‘야권 승리 지상주의자’들은 민주당 내에서 지리멸렬한 소수나 ‘제2의 후단협(후보 단일화 협의회)’이나 ‘안철수 첩자’로 분류되어 낙인 찍힐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지상주의의 일방적 대공세야말로 며칠 전(11월 14일) 단일화 협상 중단의 근본 배경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제(11월 16일) 민주당 정대철·이부영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박상천·이종찬·김덕규·조배숙 전 최고위원 등 67명의 전직 의원들이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공정한 비교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에 대한 문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들의 즉각적 반응은 “해당행위”라는 것이었다. 안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원들도 문재인과 안철수 둘 중 그 어느 쪽으로도 지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그처럼 기계적으로 해당행위라고 단정하고 단죄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위와 같은 인식 체계의 당연한 소산물이었을 게다.
지금 민주당 지상주의자들은 양쪽 팔에 민주당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녹색 완장을 찬 ‘십장(什長)’들 같다. 어떤 이들은 양쪽 어깨에 두른 완장도 모자라 굵직한 채찍까지 들고 부릅뜬 눈으로 ‘공사판’을 휘저으며 일을 안하는 불평분자들 색출에 혈안이 되는 또는 여념이 없는 것 같은 형세다.
이들은 지금의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 중심의 주류적 생각과 당권적 질서에 조금이라도 다를 것 같으면 이내 ‘용공 딱지’를 붙여버린다. 마치 과거 군부 독재시절 DJ같은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았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군부 독재자들 일부는 DJ가 빨갱이라고 확신했고, 다른 일부는 DJ가 정말 빨갱이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로 결속해서 DJ 일당을 주저없이 빨갱이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DJ는 용공이야!” 하면 그걸로 모든 이성적 논의는 끝이 나고, 그 이상의 대화는 의미를 잃어버렸던 무서운 시대의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가끔 나는 지금이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오고 있다. 지금도 많은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질서와 무서운 가치관을 이끌며 강요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것들은 안철수의 (트로이) 목마(木馬)들이야!” 하면 그걸로 끝이다. 누구도 아니라고 변호해줄 수 없다. 변호하고 있는 본인 역시 ‘용공’으로 몰릴 것 같은 등등한 기세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만다. 지금 민주당 내의 많은 이들이 이 신종 ‘용공의 덫’에 걸릴까봐 실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괄시받고 의심받는 유태계 출신 드레퓌스 대위에게 ‘용공’ 혐의를 뒤집어 씌웠을 때 그 잘났다던 프랑스의 지식인 사회는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 질풍노도와 같았던 광란의 바람(狂風)에 모두들 숨죽이고 입 다물고 말았다. 그때 에밀 졸라가 나타났다. 그리고 군부 중심의 사이비 애국자들의 비이성적 질서를 준열히 고발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2천여 년 전 당시 최강 아테네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세속주의와 허무주의적 범신론에 탐닉해 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 무서웠던 당대 질서에 “이건 아니다”며 단신 봉기했었다.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더 높은 그 무엇에 있다”는 매우 ‘반동적인’ 철학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독 당근 물을 사약으로 마시며 자기 철학을 위해 고독하게 순교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지금 우리는 에밀 졸라가 옳았고 소크라테스가 이겼다고 배우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적대적 편가르기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후진한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후진 오점으로 선명히 기록될 일이다.(2012년11월18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10:44
2026.01.01 10:44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