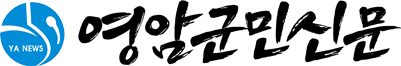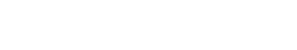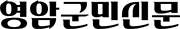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
그러나 그도 잠깐, 어머니는 나를 거실에 걸린 큰 거울 앞으로 끌고 가 세우셨다. 거울 속에 주인 할아버지가 계시니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신다. 잠깐 혼란이 왔지만,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거울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큰아들입니다.”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쳐갔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물끄러미 내 쪽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나를 오빠, 하고 불렀다. 가슴이 턱 막혔다.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 저에요. 찬열이. 엄니 아들 차-녈이!” 나를 쳐다보시던 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돌았다. “응, 내 아들 차녈이, 우리 집 장남이구나.” 어머니는 당신 무릎을 감싸고 있던 작은 담요를 가져다 내 무릎을 덮어주셨다.
나중에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아침나절은 정신이 좀 맑으신데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외출하면서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노라고 인사를 드렸다. “차 조심하고, 술 쪼끄만 먹고 얼릉 들어와라 잉,” 아침이라 그랬을까.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하신다. 아,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차 조심 하라는 얘기를 하겠는가. 새벽녘 잠결에 들려오던 쌀 씻는 소리, 호드득 호드득 아궁이에 나무 타는 소리처럼 당연하고 아늑한 저 말씀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와 함께 며칠을 보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저녁밥을 먹던 시절이 몇 십 년만인지 모르겠다.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여행 다닐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뿐이었다. 진즉 왔어야 했다. 일 년 전쯤,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왔어야 했다. 사는 게 뭔지 차일피일 미루었던 게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올 겸, 고향에 내려갔던 날,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제저녁 난리가 났다는 얘기였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루게릭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던 모리 교수가 했던 그 말. “이제 곧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때가 올 거야. 그건 내가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신호이지.” 책을 읽으면서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대목이다. 어머니도 이제 엉덩이를 남에게 맡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말이 없으시다. “금방 올게요, 어머니.” 다시 인사를 드렸다. 초점 없는 눈에 눈물이 고인다. 다 알고 있다는 듯, 금방 온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너를 보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는 것을. 네가 느끼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예감하고 있다는 듯, 내 손을 꼬옥 잡으신다.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문을 나섰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손을 계속 흔드셨다.
미국으로 돌아 온 후, 한국 대통령 선거 날 아침이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는 누구 찍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뭐하러 그런 건 물어보고 그러냐 옹삭스럽게“ 하신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아-따 엄니, 몇 번 찍으셨냐고라우.” 재차 묻자, “아야, 인자 그만 끊자” 전화를 ‘찰깍’ 끊어버리신다.
어머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렇게, 꼭 그렇게만, 오래 오래 사세요.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이 되고 말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00:50
2026.01.01 00:50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