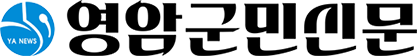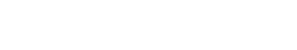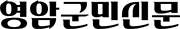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우리 아부지. 대학 등록을 마치고 서울에서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지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인사를 드리자 내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바라보셨다. 당신이 누워계신 탓에 아들 등록금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어렵게라도 등록을 마쳐준 데 대한 안도감, 그리고 혼자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하게 될 아들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 등. 그 모든 마음이 아버님의 눈 속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리자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쓰것다만….” 하고 내 의향을 물으셨다. 나는 학교 다닐 준비를 해야 하고, 묵을 곳과 일 할 곳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다.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다. 내 말이 끝나자 “그렇다면 할 수 있냐, 으짜든지 몸 성해야한다”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눈에 담아두기라도 할 것처럼 가만히 나를 바라보셨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 바람 끝이 몹시 찼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예감이 들고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하루를 더 집에 머물 여유가 나에게 없었다. 산 사람 코도 베어간다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등록은 어렵게 마쳤지만 다음 학비를 마련할 길을 찾아봐야했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잘 곳을 알아보는 일이 급했던 것이다.
서울의 바람은 훨씬 더 매서웠다. 몸은 움츠려들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자취하는 친구가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따뜻하게 맞아준 덕택에 거처할 곳이 생겼고, 여기저기 다리를 놓아 일자리도 알아보았다.
개나리가 필 무렵 학교가 시작되었다. 언덕길에 핀 노란 꽃이 등교하는 나를 화사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수업을 마치고 내려갈 때면 바람 따라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개나리처럼 환한 웃음을 웃으며 나는 그 길을 오르내렸다.
서울에 올라 온 다음, 바쁘다는 핑계로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 드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다. 숨이 막혔다.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버스를 바꿔 타면서 종일이 걸려 고향에 내려오니 깜깜한 밤이었다. 집 마당에 차일이 쳐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맞아주셨다.
아버지의 주검 앞에 오랫동안 꿇어앉았다. 많은 생각이 오갔다. 이렇게 가실 줄 알았더라면 아버지 말씀 따라 하루 더 머무를 것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단 하루를 아버지를 위해 내드리지 못했다니. 뒤 늦게 통회했다. ‘찬열’이를 여러 번 부르며 돌아가셨다는 말을 아재로부터 전해 들었다. 밖에서는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관속에 눕힌 다음, 땅 땅 땅 못을 박았다. 못 박는 소리가 적막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 또한 먼지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이제가면 언제 오나” “어~널, 어허널” 상여꾼의 구성진 소리를 따라 아버지는 영영 가셨다. 그 산길에 노랗게 핀 개나리가 눈에 부셨다.
해마다, 개나리 피는 계절이 오면 아버지 마지막 가시던 상여길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쓰것다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01:09
2026.01.02 01:09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