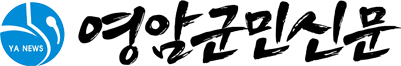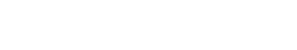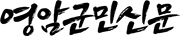|
| 김기천 전 영암군의원 |
프리모 레비(1919-1987).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자 화학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치과의사였던 그는 수용소의 끔찍한 체험을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 생생하게 남겼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저지른 폭력과 학살을 보며 좌절했다.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던 동포 유대인이 반인도적인 가해자로 표변해가는 것을 보며 깊이 회의한 것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국의 땅 가자지구에서 두 달째 눈을 뗄 수가 없다. 팔레스타인인 250만명이 살고 있는 고립무원의 땅 가자지구는 지금 불바다 피바다다. 전쟁 개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퍼부은 공습 횟수만 1만회가 넘는다. 성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안전을 누릴 단 한 틈도 없다. 삶과 죽음의 구별이 무의미한 곳, 지옥이다. 근래 숱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터지만 이처럼 좁은 땅에 이토록 집요하고 철저한 파괴와 살육이 벌어진 경우를 보지 못했다. 8미터의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인 가자지구는 남쪽으로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은 지중해다. 도망갈 곳조차 없다. 병원 학교 사원 난민촌까지 무차별 공격 대상이다. 하마스의 은신처라는 게 공격 이유다. 결국 1만6천명이 넘게 희생되었고 그 중 어린이와 여성 사망자가 70%에 달한다.
모태로부터 개신교 신앙을 체득했던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서적으로 친밀했다. 특히 파라오의 압제에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의 아우성에 전율했고 우유부단한 민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탈출하는 모세의 결기와 강단에 가슴이 뛰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식민으로 살아야 했고 군사독재의 무단통치에 치를 떨던 우리 민중의 경험과 겹쳐 자연스레 동류의식과 연대감이 싹텄다. 더군다나 2천년 동안 정처없는 나그네 삶을 살던 그들이 나치정권의 광기에 600만명이나 살육당하는 참상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래서 한동안 독립국 이스라엘의 자립과 성장을 주목했고 약소국 팔레스타인과의 공존과 평화를 염원했다. 그런데 모든 게 신기루였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들은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독립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인 70만명을 추방했고 그들이 거주할 땅도 야금야금 빼앗더니 이제는 10%만 남겼다. 종교 인종에 대한 차별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평화와 공존도 파기했다. 그토록 처절하게 혐오와 배제를 겪었던 민족이 이토록 야만적으로 타민족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오갈 곳도 기댈 곳도 하나 없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참혹한 처지를 보며 그 옛날 마구 짓밟히며 광야를 떠돌던 유대민중을 떠올리는 건 나만의 시선일까?
오늘은 팔레스타인,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열여섯 해 그 짧은 생애 중에서 다섯 번이나 전쟁을 겪고 결국 포탄에 짓밟힌 마흐무드,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5살 소녀 살리, 만화영화를 좋아했던 7살 소년 유소프, 고3 여학생 누르, 치과의사가 꿈이던 17살 마젠과 13살 아흐 형제, 유능하고 헌신적인 외과의사 미드하트 사이담(47세), 예비신부 루린(30세), 재주 넘치던 재단사 페크리야(65세)…. 지금 이들이 내 이웃이고 이들의 죽음이 곧 내 고통이다.
프리모 레비는 앞의 시 '아우슈비츠의 노래'를 이렇게 맺는다.
"한 개의 손가락으로 폭탄 단추 누르기 전에/ 잠깐만, 아주 잠깐만 멈추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12.30 11:24
2025.12.30 11:24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