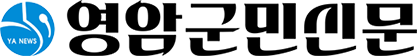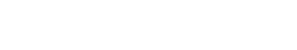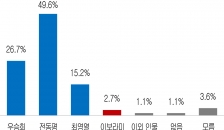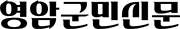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
(사)왕인박사현창협회(회장 전석홍)와 영암군이 주최하고 왕인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학술회의는 ‘왕인박사와 한반도.영암 관련성 재검토’를 주제로 열려, 한국방송통신대 나행주 교수가 ‘일본 고대국가 성립기 왕인박사와 행기(行基) 스님’, 광주교육대 김덕진 명예교수가 ‘1920년대 왕인박사 영암 출신설과 정국채’(鄭國采), 광주여대 정성일 교수가 ‘1930~40년대 영산포 일본 사찰과 아오키 게이쇼(靑木惠昇)’를, 박창재 전 국제고 교장이 ‘1950~70년대 군서학생동지회와 구림고적보존회 활동’에 관한 발제를 했다.
이어 전남대 사학과 김병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열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재용 연구위원, 호연지기콘텐츠 임희성 대표, 목포대 사학과 최성환 교수,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이 이뤄지는 등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왕인박사현창협회 전석홍 회장(전 전남도지사)은 “2025 왕인학술회의가 ‘왕인박사 영암 출생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 왕인박사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일본 고대국가 성립기 왕인박사와 행기 스님 = 나행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일본 고대국가 성립기 왕인박사와 행기 스님’이라는 발제를 통해 “왕인박사는 일본 고대국가 성립기에 해당하는 5세기 초(405년)에 왜국(일본)에 초청 파견돼 당시의 왜왕권에서 우지(宇治)태자와 닌토쿠(仁德) 천황에 대한 왕재 교육을 담당했고, 무엇보다도 왜국(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교수하면서 일본열도의 문명화(한자문화 또는 문자문화)에 기여했으며, 논어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통해 유교사상과 문화를 이식했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으로는 고대 왜국(일본)에서 문서행정을 담당한 최초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면서, “왕인박사의 후예들은 왜국(일본)에 처음으로 문자(한자)문화를 전한 박사의 후예인 만큼 고유의 직장(職掌)을 말해주는 文(書)씨를 칭하면서 오사카를 지역적인 거점으로(이에 따라 西文씨라 부름) 야마토(大和)국가의 문서행정을 담당하는 사부(史部)집단의 중핵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고대국가의 행정.운영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이어 “왕인박사의 먼 후예인 행기 스님은 나라시대를 대표하는 큰 스님으로 일본 최초의 대승정(大僧正)의 지위에 오르는데, 그 직위가 말해주는 것처럼 호국불교의 상징인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총국분사)의 조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가에 봉사하기 이전에는 왜국(일본)의 살아 있는 부처로서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활동(저수, 도로, 교량, 양로 시설 등)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특히 ‘행기 스님과 왕인 박사의 관련성’에 대해 “행기스님의 출신(출자)은 부계가 백제 도래계 씨족인 高志씨이며, 모계가 같은 백제계 도래 씨족인 蜂田씨, 즉 부모가 모두 백제계 도래씨족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동석 교수가 발표한 ‘왕인,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논문에 대해 나 교수는 “학술적 연구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제목의 논문”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왕인박사의 실존성을 따지고자 한다면 고대의 문헌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서 왕인박사를 ‘만들어진 영웅’으로 평가하는 문 교수의 논문은 학문적, 학술적 범위를 벗어난 논의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나 교수는 또 “왕인박사의 출신을 결정짓는 자료는 그 출신이 한반도계(백제계) 도래인의 후예임이 분명한 행기 스님의 ‘대승상사리병기’이다”면서, “이에 따르면 행기 스님은 백제 왕자 ‘왕이(王爾)’의 후예라고 명기하고 있다. ‘대승상사리병기’는 유해를 담아 무덤에 안장하는 용기이다. 따라서 지상에 세우는 묘비(묘비명)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후자라면 후세의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수사(修辭)나 과장, 혹은 더 나아가 사실 자체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지하에 매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기 스님을 따르는 제자(이 경우는 眞成)에 의해 약간의 정치적 수사(스승의 조상 신분을 백제 ‘왕족’ 출신으로 미화)를 가했을 수는 있지만, 출신 자체를 애써 백제로 왜곡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740년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출자를 백제에서 중국계로 개변했다면 몰라도, 백제 출신의 후예가 아닌 인물을 애써 백제계 씨족의 후예라고 조작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어 “결론적으로 왕인박사가 백제 출신이라는 점은 그 후예인 행기 스님의 ‘대승상사리병기’의 발견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1920년대 왕인박사 영암 출신설과 정국채 = 김덕진 광주교육대 명예교수는 ‘1920년대 왕인박사 영암 출신설과 정국채’라는 발제를 통해 “왕인박사 영암 출신설의 검증은 한국 고대사와 영암 지역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세 가지 측면에서 왕인박사의 영암 출신설을 검증했다.
김 교수는 “1923년 전남 광주에서 ‘전남유도창명회’가 발족됐고, 전남유도창명회는 회지로 ‘창명’을 발간했다. 1925년 1월 10일자 창명 제5호에 발행인 영암출신의 전남도청 학무과 시학 정국채가 작성한 ‘고백제국박사관왕인씨사우건설발기문(古百濟國博士官王仁氏祠宇建設發起文)’이 실려 있는데, 그 속에 ‘왕박사본거우전남지영암군(王博士本居于全南之靈巖郡)’이 들어 있어 이 글이 왕인박사의 영암 출신설을 최초로 거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라남도 학무과장 겸 시학관 대총충위가 기고한 ‘왕인씨(王仁氏)와 일본유도(日本儒道)’가 실려 있는데, 이는 왕인이 전남 출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왕인박사의 영암 출신설을 정국채가 제보하고, 그의 직속상관인 대총충위가 보증해준 셈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국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는 영암읍 용흥리 출신으로, 당시 유일한 사범학교인 ‘관립한성사범학교’ 재학 중 애국계몽단체와 국어강습소에 출입했고, 사범학교 졸업 후 영암공립보통학교 교사와 구림초등학교 교장을 거쳐 전남도청 시학을 역임하던 중에 왕인박사의 영암 출신설을 제보해 역사상 최초로 기사화하게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가 영암에서 출생해 영암에서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일찍이 국어학연구에 입문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당시 교육정책이 향토사 발굴에 힘을 쏟았던 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930~40년대 영산포 일본 사찰과 아오키 게이쇼 =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는 ‘1930~40년대 영산포 일본 사찰과 아오키 게이쇼’라는 발제를 통해 “왕인박사 영암 출생설이 1920년대 전남 유림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음은 왕인박사현창협회가 개최한 학술대회(2019, 2021년)를 통해 그 단초를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로 1919년 독립 만세 운동 이후 ‘내선융합(內鮮融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추진되면서, 1920년대 초반부터 고대 인물인 왕인박사를 상징화(형상화) 하려는 움직임이 조선의 각 지역에서 있었다. 예를 들면 1925년 6월 충남지사 석진형(1877~1946년)이 “부여(扶餘)에 왕인신사(王仁神社)를 창건(創建)하자”고 제안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1931년 11월 공주군수가 공주 번영책의 하나로 왕인 사당과 박물관을 공주에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부여(1936년, 1940~44년), 개성, 경성, 부산(1940년)의 사례도 당시 신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종 완성을 보아서 현전(現傳)하는 것은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에 세워진 ‘박사왕인비(博士王仁碑)’(1940년 4월)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식민지 관료뿐만 아니라(1925년 충남지사, 1931년 공주군수 등), 부여 출신 유학자 조락규와 도쿄의 국수주의자 시노미야 겐쇼로 대표되는 민간인들도 ‘내선융합(內鮮融合)’ 또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상징 모델로 고대 인물인 왕인박사를 상징화(형상화) 하고자 했다. 그것이 1940년 4월 도쿄 우에노 공원에 세워진 ‘박사왕인비(博士王仁碑)’로 구체화됐으며, 그것이 3년 뒤인 1943년 4월 식민지 조선의 부여신궁 경내에 건립하려 했던 ‘왕인박사비’로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부여의 왕인박사비’ 건립은 부여신궁과 함께 미완으로 끝나 그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역사고증이나 문헌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인지 그 뒤 지금까지도 부여나 공주지역에서 왕인박사와의 연고나 관련성을 주장하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영암이 왕인박사의 출생지(또는 출신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종합토론 = 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나행주 교수가 “왕인박사를 일본 고대국가 성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실존 인물로 규정하고, 그의 문화적.제도적 영향력을 풍부한 사료와 논거를 통해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한다”면서 “비슷한 시기 일본에 건너간 아직기의 전승이 실제 유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를 고려하면, 왕인 또한 실재 인물로서 일본열도 내에서 문화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왕인의 실존을 부정하는 일부 연구에서는 천자문이 양나라 때 주흥사에 의해 편찬되었으므로, 그 전수시기를 6세기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천자문은 위나라 종요(鍾繇의 천자문이 이미 존재했고, 논어 또한 위나라 하안(何晏)의 논어집해와 황간(黃侃)의 논어의소가 있다. 따라서 왕인이 전한 천자문과 논어가 반드시 일본 고대국가 성립기 주흥사나 황간의 저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희성 호연지기콘텐츠 대표는 토론을 통해 “1920년대라는 시기적 배경을 통해 ‘영암 출신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역 정체성과 결합되었는가를 살펴본 김덕진 교수의 문제의식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왕인박사의 출신지’라는 논쟁을 넘어 ‘지역에서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미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는 정성일 교수의 ‘1930~40년대 영산포 일본 사찰과 아오키 게이쇼’ 연구에 대해 “‘왕인박사 담론’의 형성과 변용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왕인학회의 새로운 성과들이 대중들에게, 특히 ‘영암왕인문화축제’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 영암문화관광재단 이사회에서 왕인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왕인학회의 학술행사를 통해 밝혀진 국내 기록의 ‘왕인 영암 출생설’ 등의 성과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학술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6.01.05 18:22
2026.01.05 18:2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