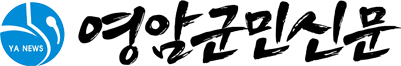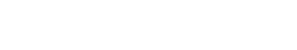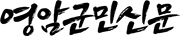|
을묘년 5월 11일(이하 음력), 당시 영암 땅이었던 달량진성(현 해남군 북평면)에 70여 척의 왜선에 조총으로 무장을 한 6천여 명의 왜구가 나타나면서 영암 땅은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가리포(현 완도항)를 지나 영암 땅에 모습을 드러낸 왜구들의 모습은 괴기한 복장에 천둥소리를 내는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들고 나타났다. 영암군수 이덕견 등이 참전한 달량진성의 전투는 왜군의 압도적인 숫자와 신식 무기에 압도되어 조선군의 대패로 이어졌다. 달량진성의 전황은 삽시간에 퍼지면서 강진, 병영, 장흥 등을 지키던 장수와 현감들은 왜적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하기에 바빴다.
왜적은 나주를 거쳐 전주로 향하는 길목인 영암 땅을 향해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신속히 압박해오고 있었다. 영암으로 향하는 길에 왜군들은 변변한 저항도 받지 않고 지나오는 모든 지역을 무혈 입성하였다. 그 사이 전라관찰사 김주(金澍)는 이덕견 영암군수가 달량성에서 왜군에 항복하여 포로가 된 후 공석이었던 영암군을 이끌기 위해 전주부윤 이윤경(李潤慶)을 영암으로 급파하고, 전라우도 방어사 김경석, 전라좌도 방어사 남치근을 영암성으로 보내 왜군을 막도록 하였다. 이윤경의 동생 이준경은 전라도 순찰사가 되어 나주에 머물러 있었다. 5월 24일 왜군은 드디어 영암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영암향교(현 역리 3구 괴성개 마을 - 괴성개는 옛 향교를 뜻함)에 진을 친다.
영암사람들은 해남 현감을 지낸 양달사(梁達泗)를 설득하여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관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5월 25일, 양달사 의병장을 중심으로 하는 영암사람들이 남사당 공연에 넋이 나가 있던 왜군들을 급습하여 승기를 잡았다. 동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군들까지 일제히 밀고 나와 배후를 공략하니 왜군은 속수무책으로 패퇴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군더리 방죽(현 영암공설운동장 인근)에서 더 큰 피해를 본 왜군은 왔던 길을 되짚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도주하였다. 아쉬운 점은 전라좌도 방어사 남치근이 남평에 머물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왜군을 섬멸하여 이후 이어진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영암성의 승전보를 듣고 뒤늦게 도착한 남치근 등은 왜군의 뒤를 쫓았지만, 왜군은 벌써 병영성과 강진현을 약탈하고 사라진 뒤였다. 영암사람들과 영암성의 관군이 하나로 뭉쳐 왜군을 물리쳤지만, 병영성과 강진현을 지키던 관군들은 패퇴하던 왜군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한 달 가까이 남해안에 머물며 피해를 주던 왜군들은 영암성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관군의 총공세에 보길도를 떠나 제주로 향하여 6월 27일 화북 포구에 상륙하여 제주성을 공격하였다. 천여 명이 넘는 왜적을 맞았지만, 영암성의 대승은 제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고, 민관이 하나가 되어 3일 만에 왜적을 패퇴시키면서 을묘왜변을 종식할 수 있었다.
영암성 승전의 요인으로 명종실록(명종 10년 5월 29일)에 사관은 “사신은 논한다. 왜구들이 감히 멋대로 돌격하게 된 것은 장수들이 두려워하여 물러나 움츠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구들은 공격하면 무너지고 쫓아가면 도망하여 조금만 군사의 위엄을 보여도 도망하여 숨기에 바빴다. 이러므로 영암에서의 승전도 또한 효용군(驍勇軍) 10여 명이 먼저 싸운 데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장 날랜 용사들로 구성된 효용군이 선봉에 서서 대승을 이끌었던 영암성대첩과 치마(馳馬) 돌격대의 선봉으로 승전할 수 있었던 제주대첩은 유능한 지휘자가 있었고, 민관이 하나가 되어 왜군을 패퇴시켰다는 점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영암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응축 기점이 되었던 양달사 의병장, 왜군의 공격으로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는 친동생 전라순찰사 이준경의 간곡한 회유에도 영암성(靈巖城)을 사수하며 관군을 이끌었던 전주부윤 이윤경 등은 영암성대첩의 논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영암사람들과 의병장 양달사의 대첩 당시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정사(正史)에서 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대로 정사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지역 향토사에서 이윤경 등 관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영암성대첩이라는 큰 그림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 영암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영암성대첩의 의의를 살리고 계승하기 위해 향토 사학과 강단 사학의 유연성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12.23 09:04
2025.12.23 09:04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