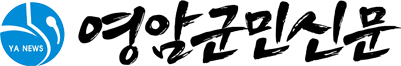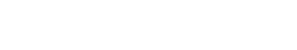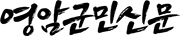|
바랭이는 부추처럼 초록색인 데다 뿌리 또한 부추와 맞닿아 있어 처음 뽑을 때는 상당한 인내와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다 점차 숙달되다 보니 할머니 흰머리 뽑아내듯이 그 재미가 쏠쏠해졌다. 불현듯 어릴 적 기억이 새롭다. 그날도 저녁상을 물리신 아버지는 으레 목침을 베고 모로 누우신 채 흰머리 뽑기 임무를 주셨다. 등유로 불 밝히던 시절인 데다, 유독 머리숱이 검고 많으셨던 터라 흰색을 찾아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리저리 놀리면서 검은 머리털 속을 샅샅이 수색했다. 마침내 한두 개가 포착되었다. 행여 놓칠세라 양 엄지와 검지로 단단히 붙잡은 다음 힘주어 뽑아올렸다. ‘똑’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칭찬이 이어졌다. 겨우 서너 개 뽑고 나서 졸린 표정을 지으니 임무는 곧바로 종료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부추밭의 바랭이처럼, 그때 아버지의 흰머리가 바로, 아들의 작은 손을 빌려서라도 뽑아내고 싶었던, 삶을 옥죄는 옹이들이었을 것이다.
지금 부추하면 크고 통통한 개량종이 대세지만, 그때는 작고 가냘픈 토종 부추를 일컬어 솔이라 했다. 솔 하면 늘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때 그 시절, 우리 집 솔밭은 부엌에서 최단 거리에 있었다. 뒤안 한 켠 한 평 남짓한 공간, 그곳은 어머니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였고 최후의 보루였다. 솔가지를 태워 밥을 짓고 오이며 가지 등 찬거리로 뚝딱 저녁상을 차려 우리 오형제를 배불리셨다. 식구들이 곤히 잠들면 어머니는 아궁이에 수북히 쌓인 재를 솔밭에다 뿌리고 물을 주셨다. 종종 찬거리가 옹색할 때면 그새 성큼 자란 솔잎을 몇 움큼 베어다 오물조물 무쳐주셨다. 반찬 투정을 하려 해도 엄마표 ‘솔지’ 맛에 취해 금새 누그러지곤 했다. 어머니는 늘 하교하는 아들을 솔밭에서 맞아주셨다. 어떤 날은 솔들 숨 잘 쉬라고 김을 메주시면서, 또 어느 날은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을 한 움큼 눈물과 함께 솔들에게 털어놓으시면서 말이다.
우리 부부 결혼식 주례사가 생각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주례 선생님께서는 그날 ‘날마다 마음의 밭(心田)을 일구라’고 말씀하셨다. 35년이 지난 지금 솔밭에 앉아서 새삼 그 의미를 곱씹어 본다. ‘심전’을 잘 일구기 위해서는 마음의 잡초를 잘 뽑아내야 하겠다. 뽑아도 뽑아도 근절되지 않고 자꾸만 올라오는 솔밭의 잡초처럼, 내 마음의 잡초 또한 조금만 방심해도 그 틈을 노려 스멀스멀 파고들 것이다. 선행과 자선, 친절한 대인 관계 속에서 조용히 똬리를 틀고 있는 편견과 교만, 게으름과 악습이야말로 무엇보다 먼저 뿌리 뽑아야 할 잡초일 것이다.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 전쟁과 핵 위협, 무역과 식량 전쟁,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등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중차대한 과제조차도 내 마음의 잡초를 뽑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12.16 08:31
2025.12.16 08:31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