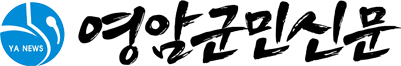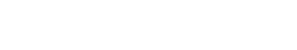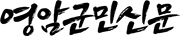|
석전이란 문묘에서 공부자(孔夫子)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일컫는다. 그 목적은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부자께서 남기신 인의(仁義) 도덕의 이상을 근본으로 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다. 또한 석전을 거행할 때는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서 생폐예제(牲幣醴齊)를 헌설(獻設)하고 孔夫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해야 한다.
석전은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의 학문과 인격, 덕행과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하고 존중하며 스승을 높이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문묘(文廟)에서 거행하는 의식(儀式)이다. 그러므로 왕실의 사당인 종묘(宗廟)나 문중의 제사처럼 복을 비는 의식이라기보다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성현(스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가르침인 예와 의를 실천하는 체험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석전제의 최고 추모 대상인 공부자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 칭한다. 대성(大成)은 맹자(孟子)의 ‘집대성(集大成)’에서 유래했으며, 지성(至聖)은 지극한 성인, 문선왕(文宣王)은 문화를 베푸신 왕을 칭한다. 즉 덕이 지극히 뛰어나고 학문을 널리 펼치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제향(祭享)
일반적으로 ‘제사(祭祀)’는 신령(神靈)이나 죽은 사람의 혼령(魂靈)에게 술과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우리나라 ????國朝五禮儀????에서는 이 제사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천신(天神)에 대해서는 ‘사(祀)’, 토지의 신인 지기(地祇)에 대해서는 ‘제(祭)’, 인귀(人鬼)에 대해서는 ‘향(享)’, 문선왕(공자)에 대해서는 ‘석전(釋奠)’이라 구분한다.
향교와 서원의 고유한 기능은 교육 기능인 ‘강학(講學)’과 제사 기능인 ‘제향(祭享)’이다. 향교와 서원은 기본적으로 학교인 만큼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동시에 선현(先賢)·선사(先師)에 대한 제향 기능 역시 매우 중요했다. 향교와 서원에서 행하는 제향은 일종의 유교식 종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향교와 서원에서 행하는 제향은 엄밀히 말해 일반적인 기복(祈福)적 성격의 종교의식과는 달랐다. 다시 말해 향교와 서원의 제향은 복을 비는 의식이 아닌 일종의 ‘모델링’ 효과를 기대하는 교육의 한 방편이었다는 점이다. 선현(선사)들에 대한 제향의식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선현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제사는 지상의 인간이 하늘에 있는 신들과 교감하기 위한 행위이니 무엇보다도 신을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할 것이다. 종묘(宗廟)의 대제(大祭)는 국가의 조상에 대한 제례이므로 술을 땅에 부어 신을 초대하는 뇌주관지(酹酒灌地)를 하지만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은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는 제례이므로 뇌주관지(酹酒灌地)를 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 성균관 집례의(成均館 儀禮集) - 자료편집 협조 : 영암향교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5.12.08 19:49
2025.12.08 19:49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