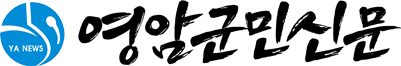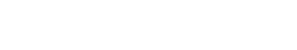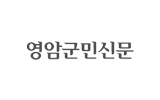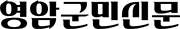지금이야 모두 논이 되어버렸지만 그리 멀지 않은 옛날, 그 인근은 밀물이면 아득히 수평선이 보이는 강이었다. 고깃배가 닻을 내리고 물 따라 어민들이 개펄을 들고나던 작은 포구였다. 거기, 장정 서너 명이 손을 잡아야 둘레를 잴 수 있을 만큼 큰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둘레가 그만치였으니 키도 하늘에 닿았다. 뿌리가 울퉁불퉁 불거져 나와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나무의 나이를 몰랐다. 몇 백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나이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민들은 밤낮이 아닌 물때를 따라 강으로 나갔다. 여러 척의 배가 모여 개맥이로 고기를 잡던가, 뜰망배로 새우나 자애를 건졌다. 맛이나 기를 잡으로 개펄에 들어가는 아가씨들은 팽나무 아래 옷을 놓아두고 들어갔다. 총각들도 대갱이를 잡으로 갈 때 나무 부근에서 신발을 벗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두런두런 온갖 얘기들을 나눴다.
팽나무는 강에 나간 어민들의 귀환 표적이었다. 멀리 석화 잡으러 갔던 날, “쩌그 저 팽나무를 보고 똑바로 가라”는 아재의 말을 따라 깜깜한 그믐밤의 강을 노 저어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팽나무는 인근 어민들의 고단하고 힘든 생을 대대로 지켜본 증인이었다. 태풍 때 어선이 뒤집히는 모습도, 봄철 게를 잡으러 오가리를 품에 안고 물 따라 개옹을 내려오던 꽃다운 처녀가 급물살에 휩쓸려가던 안타까운 장면도 지켜보았다. 중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내가 처음 대갱이를 잡으러 갔던 날, 잡은 고기가 한 뼘도 못된 내 뀌미를 보고 대갱이를 나누어 주던 친구들의 얼굴도 기억할 터이다.
그 즈음 추석날 밤. 팽나무 아래 숨겨둔 노를 끄집어내 남의 배를 끌고나가 보름달 아래 뱃놀이를 했다. 강물이 출렁이면 물 위에 드리워진 달빛이 파도의 이랑을 따라 눈이 부시게 흔들렸다. 물결 따라 청춘들이 출렁거렸고 술잔 속의 추석달도 함께 흔들렸다. 종철이 종두, 판열, 시영, 관주, 정열…. 친구들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팽나무는 언제보아도 당당했다. 검푸른 위용을 자랑하며 펄펄하게 기가 살아있었다. 아득한 옛부터 포구를 지켜온 수호신답게 언제까지 거기 그렇게 있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 미국에서 건너와 고향 방문길에 가락끝을 찾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팽나무가 말라 죽어있는 게 아닌가. 그토록 싱싱하던 거목이 저렇게 힘없이 스러지다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물은 온데간데 없고 아득한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간척사업으로 개펄이 농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무는 강바람이 불어오지 않자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을, 가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던 것일까.
며칠 후면 추석이다. 보름달 아래 우뚝하던 거목, 한 생을 푸르게 살다 간, 가락끝 팽나무를 생각한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하는 가를 한 그루 나무로부터 배운다. 살아있는 것들은 세월과 함께 차고 저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14:38
2026.01.01 14:38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