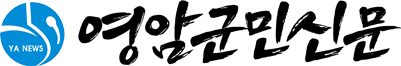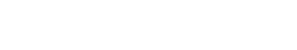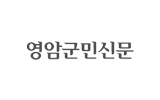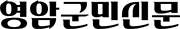혁명은 정치학에서 보다 체계화되어 쓰인다. 원래는 통치형태의 순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탱크와 총칼을 앞세운 엄연한 정권찬탈인 5·16쿠데타 같은 일을 혁명으로 미화하려는 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혁명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를 전복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산업혁명처럼 사회적, 경제적 근본 틀의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후자의 혁명을 ‘인류의 진보를 위한 힘’이라고 보았다. 헤겔은 더 나아가 ‘인간운명의 완성’으로까지 생각했다.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즉 과학혁명도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일맥상통한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우리사회엔 예전에 전혀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름 아닌 ‘구 체제에서의 탈피’다. 정치학자들은 정당정치의 실종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파벌개념에 안주해온 정당의 해체, 즉 파벌에서 정당으로의 이행과정이라고 보아야 옳을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결과가 혁명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신인에 가까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다수로 야당 후보로 선출되고, 안철수 교수가 열렬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성황은 분명 우리의 인식체계를 넘어선다. 구체제에 안주해온 이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14:40
2026.01.01 14:40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