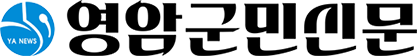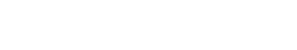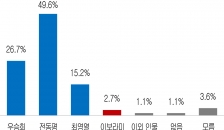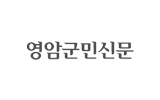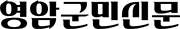신정(新正:양력 1월1일)이 있기는 하나 설날을 새해 첫날로 보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긴 하다. 하지만 농업을 주업으로 여겨온 우리 조상들에겐 절기상 첫 번째인 입춘이야말로 새해 첫날이었다.
입춘 전날, 그러니까 올해는 설날이 절분(節分)인 셈인데, 이는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옛 조상들은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고,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았다고 한다. 입춘을 연초처럼 본 것이다.
입춘 후 우수(雨水)까지 15일 동안은 동풍이 불어 언 땅이 녹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고 한다. 삼라만상이 긴 겨울에서 깨어나는 때가 바야흐로 입춘임 셈이다.
고려시대 입춘 날은 관리들에게 하루휴가가 주어지는 공휴일이었다고 한다. 입춘하례가 행해지고, 왕은 관리들에게 대문 등에 붙일 좋은 글귀를 써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입춘첩(立春帖)이다.
내용은 다양하고, 붙이는 장소도 정해져 있다. 立春大吉 建陽多慶, 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壽如山 富如海, 掃地黃金出 開門百福來, 去千災 來百福, 災從春雪消 福逐夏雲興 등등.
이밖에 입춘에는 입춘 전후 받아둔 빗물인 입춘수(立春水)로 술을 빚어 마시거나 보리뿌리로 그 해 농사를 점치는 맥근점(麥根占)도 보았다고 하나 오늘날엔 이미 사라진 풍습이다. 어쨌든 흩어진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번 설날과 입춘엔 새 출발을 다짐하기에 안성마침인 것 같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25
2026.01.03 08:2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