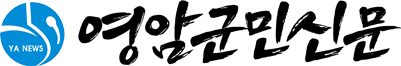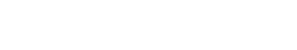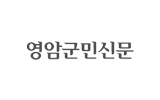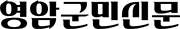|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제비도 맛으로 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수제비, 칼국수, 풀빵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늘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한다. 수제비를 6·25전쟁 때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에서 비롯된 음식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그 이후 제분공장에서 만들어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된 게 바로 밀가루다. 미국의 무상원조 악수표 밀가루로 국민들은 빵과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고, 배를 채웠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삶을 지켜주던 밀가루를 제분하던 공장들이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는 뉴스가 들린다. 한때는 ‘표백제 덩어리’, ‘방부제 범벅’이라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목포시 삼학도 복원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제분 사일로 발파작업이 지난주 있었다. 한국제분 목포공장이 충남 당진으로 이전함에 따라 목포 대삼학도 산기슭에 자리한 한국제분(주)의 공장동, 제품창고, 콘크리트 사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었다. 복원화 사업의 큰 걸림돌 이었던 38m 높이의 사일로 14기는 화약발파 전도방식으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장동(7,200㎡)과 제품창고(8,600㎡)는 장비압쇄공법으로 추진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이제 대삼학도의 아름다운 바다 조망은 살아 났을까?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三鶴島)는 ‘세 마리의 학이 내려앉아 섬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깃든 섬이다.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에도 나오는 삼학도는 1962년 매립공사로 육지가 됐다. 목포항이 비좁은 탓에 대형선박용 항만공사를 하면서 심하게 훼손됐고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면서 섬의 정취도 사라졌다. 하지만 목포시가 2006년부터 복원에 나서면서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삼학도 복원사업의 최대 걸림돌 41년 된 건축물 한국제분 목포공장이 철거됨으로서 삼학도 복원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14년까지 1,243억 원이 투입되는 삼학도 복원사업은 소삼학도와 중삼학도 호안수로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만들고 다리 9개를 놓는 등 옛 모습으로 복원해 2010년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앞으로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목포를 대표하는 친수공원이자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소식을 기뻐만 해야 할까? 전남 목포의 ‘1세대 향토기업’인 행남자기가 설립 70년 만에 본사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한다. 보해와 그 외 많은 기업도 이미 우리 지역을 떠났다. 지역 향토기업의 이탈은 우리 지역 전통 제조업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이게 한다.
물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산업이 그 자리를 이어 주고 또 산업의 재편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중견 제조기업이 떠난 부지가 주택가와 공원으로 변모하는 것이 늘 흐뭇하지는 않다. 보해, 호남제분, 행남자기 등이 주력기업으로 활동하던 시절 월급날 시내 거리가 흥청거렸고 이날만은 부장님, 사장님보다 경리를 담당했던 여직원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던 아련한 추억을 우리 주민들은 기억속으로만 간직해야 하는가?
영암군도 인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무엇보다 우리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군민들이 상생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상생을 표방 하면서, 상생은 커녕 기업만 죽으라 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행동과 노력 없이 절대 상생 할 수 없다. ‘相生’, 흔하지만 어려운 말이다. 단순한 시혜(施惠)적인 차원의 해결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그 기업과 사랑하고 상생하며 영원히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기업을 우리 주민들이 함께 했으면 하고 바래본다.
(crose@db.ac.kr)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18:11
2026.01.01 18:11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